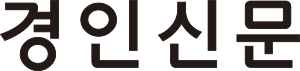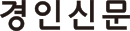[경인신문=김신근 기자] 예로부터 시장은 소비자와 판매자(생산자와 유통업자)가 만나는 곳이었다.
모처럼 열리는 장터에서 물건을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는 눈치와 실랑이를 펼치며 가격을 흥정한다. 또한 장터는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서 세상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었다.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은 강원도 봉평장이 무대다. 장돌뱅이 허생원이 소싯적 하룻밤 정을 나누고 헤어진 처녀를 잊지 못해 봉평장을 거르지 않고 찾으면서 젊은 동이를 만난다는 이야기다.
용인 중앙시장에서 5일마다 열리는 오일장은 수도권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전통시장이다.
오일장이 열리는 5/10일이면 송담대역에서 김량장역에 이르는 1km의 거리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용인시도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3개 공영주차장을 마련했고, 하천변 편도 1차선의 노면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장날을 찾는 사람들은 대형마트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찾고 있다.
사계절 개장하는 장터이기에 계절마다 판매 품목도 다르다. 최근에는 김장철을 앞두고 고추, 마늘 등 양념채소와 귤, 단감, 사과 등 제철과일과 함께 매대에 많아 올라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 5일마다 서는 장에는 같은 장소에 같은 상인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마치 지정석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장사는 터가 좌우한다는데 어떻게 매번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이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들 ‘보이지 않는 손’이 질서비(또는 청소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긴다면, 이는 판매 상품에 포함되어 결국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장날을 찾는 사람에겐 추억과 낭만을 찾는 장소이지만, 장날을 준비하는 사람에겐 생계를 위한 현장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에게는 수수료가 입금되는 날이라는 게 서글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