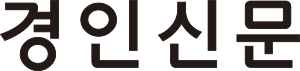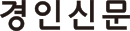편집자주 = 이 글은 김왕석 전 교수가 직접 작성한 글로, 글의 내용에 대한 편집 없이 오탈자 검수 후 원문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경인신문의 편집방향이나 데스크와 편집자의 의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 김왕석 전 교수 ©경인신문 |
영화가 끝났다. 불이 켜지자 “휴~” 하는 소리가 들린다. 긴장을 놓는 소리다. 가까이서 “뭐지? 무슨 내용이지?” 또 다른 소리가 들린다. 영화가 너무 폭력적이고, 어두워서...푸념하는 소리다. 함께 간 아내까지 가세한다.
“영화가 어려운데...어려워!”
분명 영화를 보았는데 전체 내용과 줄거리의 핵심이 뒤숭숭하다. 다들 어렵다 하니, 우선 ‘기생충’ 영화에 대한 핵심 내용을 재구성해 보자.
이 영화는 경제환경이 다른 두 계층의 가족들이 등장한다. 한쪽은 부유하고 쾌적한 환경이 펼쳐진 고급주택에서 살고, 다른 한 쪽은 퀴퀴한 냄새가 나는 열악한 환경의 반 지하에서 살고 있다.
또 상위계층은 매일 같이 치밀하고 계획, 전략적으로 생활하고, 하층계층은 무계획 속에서 임시변통으로 하루하루를 생활한다. 그리고 하층계층간의 생존투쟁은 치열하고 섬뜩하며, 더 참혹하다.
또한 호화 파티장에서의 계층 구분은 더 확실하게 보여 진다. 혈전 후 달라진 것은 없다. 하층계층에게 돌아온 것은 다시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지하실뿐이다. 계층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앞의 내용을 더 축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계층 간의 갈등(葛藤)’이다. 둘째는 계층 간의 갈등이 ‘폭력(暴力)’을 매개로 전개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영화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다. 세 가정과 10명의 가족 수, 구성도 내용전개도 심플하다. 그런데 영화를 본 사람들은 왜 영화내용이 난해하고 와 닿는 메시지가 없다고 말 할까?
원점으로 돌아와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뜻밖의 사소한 일로 폭력과 살인이 일어난 것에 대한 비현실감이 한몫 한 것 같다. 대화 몇 마디, 찰나적인 순간에 맞게 되는 퀴퀴한 냄새, 그런 사소한 것들이 그토록 어마어마한 폭력과 살인까지 확대 될 수 있을까 하는 당혹감이 작용했다.
둘째는 계층에 대한 소속감없이 영화를 본 이유이다. 영화가 아무리 하층계층간의 대립이라 하여도 막상 눈 앞의 폭력, 살인을 보고난 나는 그들과 같은 계층으로 소속되는 것을 거부한다. 결정적으로는 나의 삶의 공간은 지하는 아니라는 심리적인 강한 거부감 때문이다. 바로 의식보다는 무의식적 작용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셋째는 폭력과 살인충동을 외면하는 내 정신 속의 '자아(自我)' 때문이다. 폭력이나 살인행위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을 계획하거나 명령하는 것은 정신이다. 이 영화처럼, 작고 사소한 사건으로도 살인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아는 마치 화산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끓고 있는 마그마와 같은 것이다. 폭력과 살인충동, 그것의 진원지가 바로 자아라는 점을 알게 되는 것은 심각하다.
그럼 왜 그것이 심각한가? 자아란 정신의 중심이자 본질이다. 그냥 오락, 쾌락, 박력으로 폭력과 마주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 속에 잠재한 폭력의 원형을 민낯으로 보는 것은 우리 자신도 절대 원치 않는 일이다.
수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유전된 폭력·살인충동과 마주하는 것을 억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인간정신의 기본적 '방어작용'이다. 이 영화의 구성, 계층갈등, 그리고 폭력의 전개 등은 깔끔하다. 그런데도 혼돈을 겪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식(意識)’과 ‘무의식(無意識)’적 작용 때문이다.결론을 맺어보자. 영화 기생충은 사람의 정신 속에 폭력이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가를 폭로하고 있다. 사람의 폭력성은 심리적으로 오랫동안 자신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선택의 결과였다.
이 영화가 끝나고도 영화 속의 폭력성을 우리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이유이다. 우리의 가슴속에 잠재된 폭력성을 이해하는 일이 곧 명상의 몫이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에도, 우리들은 우리들 가슴 속에 잠재된 폭력을 철저히 외면했다. 봉준호 감독은 철벽보다 훨씬 강한 우리들 가슴속의 폭력의 벽을 깨우기 위해, 131분 동안 처절하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더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중앙대학교 김왕석 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