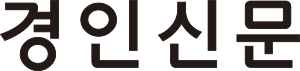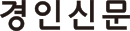편집자주 = 이 글은 김왕석 전 교수가 직접 작성한 글로, 글의 내용에 대한 편집 없이 오탈자 검수 후 원문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경인신문의 편집방향이나 데스크와 편집자의 의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 김왕석 전 교수 ©경인신문 |
화창한 날씨에 햇살이 눈이부시다. 평일의 하오, 편안히 단상에 젖는다. 아침에 읽다 만 신문의 한 귀퉁이에 ‘닥터 데스’의 기사가 눈에 띈다.
닥터 데스는 죽음의 의사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의사이다. 필립 니쉬케 박사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집행한 의사다. 1996년 호주에서 시한부 환자 넷에게 독극물을 투여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의사면허를 박탈당한 그는 지금은 이주해 네델란드에서 안락사를 연구하고 있다. 그에겐 살인자와 죽음의 천사라는 비난과 찬사가 함께 쏟아진다. 안락사의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자.
자연의 섭리란 모든 생명에게 공평하다. 태어나고 성장할 때는 힘과 에너지가 축적되고 발산 되지만, 죽음과 쇠락의 시기에는 병마와 에너지의 소멸이 눈에 띈다.
생명의 끝은 그 끝맺음도 소멸의 원리에 따라 극심한 고통이 뒤따른다. 암 말기환자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가 그렇다.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당사자는 대부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한다. 더 나아가 고통이 극에 달하면, 극한의 고통의 마지막 삶은 존귀와 품위로 끝을 맺고 싶어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의의 사고와 질병, 죽음의 문제를 명상과 연관 지어 보기로 하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명상을 오래한 사람은 죽음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은 사멸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순환과 사슬의 이치라고 본다. 또 죽음은 한방울의 물방울이나 나무 조각처럼 시냇물과 함께 흐르는 것이라 생각한다. 죽음은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순환에 이르는 것이다.
명상은 무념무상과 무아를 실현하는 일이다. 모든 생각의 근원을 이해하여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여 기쁨과 행복을 얻는 일이다. 질병과 불의의 사고로 정신과 육신의 활동이 치명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우리는 삶속에 때로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오직 진통제와 모르핀에 의존해야 하는 삶, 죽을 때까지 참고 견디는 처참한 삶의 시간과 순간들, 그들에게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자. 더 공포스런 삶의 순간들이 이어질까? 아니면 더 자유스럽고 여유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까? 여러분은 어떠할 거라 생각하는가?
이 글은 필자의 사견임을 전제하며, 아래의 글로 끝맺음을 대신하고자 한다. 안락사는 소유도, 탐욕도 아니다.
우리 자신의 마지막 삶이 고통과 공포의 손아귀에서 헤매 일 때, 극심한 고통앞에서 평생을 지켜온 삶의 품격과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고통을 견디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상황에서 과연 마지막 삶의 품격이 지켜지겠는가? 그것이 불의의 사고자나 암 말기환자들의 삶의 끝이라면, 그 끝이 너무 참혹하지 않은가?
허둥허둥 쫒기 듯 이 세상에서 내몰리기 보다는, 환자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마지막 삶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고통 없이 세상과 작별하는 것이 훨씬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현대 의술과학으로도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더더욱 죽음은 끝이 아니라, 순환과 사슬이라는 명상의 이치를 깨닫는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헝클어진 머리를 빗고, 그들이 마지막 통곡의 벽을 넘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다.
중앙대학교 김왕석 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