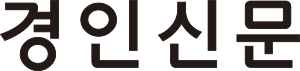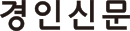편집자주 = 이 글은 김왕석 전 교수가 직접 작성한 글로, 글의 내용에 대한 편집 없이 오탈자 검수 후 원문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경인신문의 편집방향이나 데스크와 편집자의 의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 김왕석 전 교수 ©경인신문 |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최근 명대사로 잔잔한 감동을 주며 흥행이 됐던 드라마 ‘눈이 부시게’가 막을 내렸다. 그런데 마치 잠속에서 꿈을 꾸다 깨어난 사람처럼 주인공 김혜자의 정신세계가 나의 의식처럼 생생하다. 도대체 왜 이 드라마는 그 여운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일까?
먼저 이 드라마의 전체를 관통하는 ‘눈이 부시게’ 라는 시각적 감정부터가 특이하다. 눈이 부시게란 도대체 어떤 감정상태인가? 똑같은 날씨를 보아도 어떤 이는 무덤덤하게 그냥 날씨가 좋다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이는 기쁨과 희망, 행복의 마음을 실어 좋은 날씨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김혜자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녀의 눈에는 이 세상이 벅참, 기쁨, 용서, 포용, 자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랑과 행복이 물결치는 세상으로 보인다.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참하고 불행, 질투, 경쟁, 시기로 가득찬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간다. 그런데 알츠하이머 환자인 그녀의 눈에 비치는 이 세상은 왜 그토록 눈이 부신 것일까? 그 감동, 그 기쁨, 그 행복, 그 비상의 감정이 어디에서 솟아난 것일까?
이 드라마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치매, 죽음, 시간의 역린, 그리고 사랑의 문제 속에서 그 연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알츠하이머’ 병에 관한 것이다. 알츠하이머는 기억상실이나 기억장애 질병으로 더 알려진 질병이다. 정도의 차이일 뿐,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다. 아득한 일 같지만 막상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면, 먼 미래의 일도 남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일은 곧 나에게도 닥칠 일이고, 마치 나의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게 된다.
다음은 죽음의 문제이다. 주인공 김혜자는 죽음 앞에 섰다. 그녀가 남기는 한마디 말들은 그래서 더 소중하고 간절하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죽기직전까지 생활을 추구한다. 생활이란 무엇인가? 내 직장, 내 가족, 내 지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절벽처럼 생활이 뚝 끊기고 죽음이 찾아온다. 그때 우리는 비로써 생각을 하게된다. 함께 살며 고마웠던 사람들, 원한과 분노의 경험들, 살면서 겪었던 가슴시린 사건사고의 기억들이 또박또박 떠오른다. 어떤 사람의 죽음인들 다르겠는가? 김혜자의 모습에서 나의 죽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더 생생하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역린하는 것도 감동에 큰 몫을 한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정비례 순서에 익숙하다. 그런데 이 드라마 속에서 아들의 교퉁사고의 순간순간의 장면들이 시간의 혼합으로 편집 되어 교차한다. 영상은 고통의 순간을 더 집요하게 파고든다. 어떤 때는 사고의 순간을 느린 화면으로 몇 번이고 반복한다. 상처와 고통의 순간을 피하려하지 않고 관찰과 이해를 분명히 하려한다. 고통의 순간과 정면으로 맞서 치유의 계기를 만들고자 함이다.
이 드라마를 더 눈이 부시게 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용서, 자비, 관용의 정신이다. 남편을 고문했던 수사관의 고뇌와 참회에 화해와 용서로 포용한다.
노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금을 약탈하려 했던 홍보관도 그들의 처절한 생존방법이란 ‘측은지심(惻隱之心)’과 동정을 갖게 한다. 그들의 삶도 자비로 끌어안는다.
“왜 눈을 쓰세요?”아들이 물으니 알츠하이머를 앓은 어머니가 대답한다. “제 아들은 장애가 있거든요” 평생 아들을 강하게 키우기만 했던 어머니의 속마음을 알고 우리는 속으로 조용히 흐느꼈다.
사랑은 어떤 사고도 동기도 존재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 그것은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 속에서 이런 순간에 집착한다.
글을 맺자. 사랑은 소유나 탐욕이 아니다. 가장 높은 사랑의 경지는 무념과 무아다. 그 속엔 ‘나’라는 ‘자아’가 중심이 아니다. 이웃에 대한 용서와 자비, 동정, 존경, 포용이다. 자아가 없는 완전한 공감, 이 공감은 완전한 자기 망각 속에서만 일어난다. 무아, 그것이 사랑과 명상의 최고 경지인 것이다. 김혜자의 눈부심이 바로 그 경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앙대학교 김왕석 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