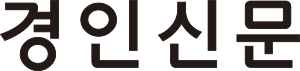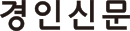편집자주 = 이 글은 김왕석 전 교수가 직접 작성한 글로, 글의 내용에 대한 편집 없이 오탈자 검수 후 원문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경인신문의 편집방향이나 데스크와 편집자의 의도와 관련이 없습니다.
 ▲ 김왕석 전 교수 ©경인신문 |
요즘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정치권의 정쟁이 치열하다. 각 당의 정치이념이 다르니 다른 것의 차이에서 오는 다툼이려니 할 수 있다.
국회는 원래 토론과 대화를 통해 문제에 대한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원형이다. 급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단적인 경우에 그 억울함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에게 지지를 얻고자 한 것이다.
정치권의 이러한 방식자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늘상 그래왔던 일이다.
셈의 역학이 근간이고 보면 강한자는 밀어 붙일려 할 것이고 약한자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해 대응해 보려는 방법일 것이다. 다 좋다. 여당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일일 터이고,야당도 어떻게든 저지가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여당도 야당도국민들께 명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만약에 손해볼 일이 있다면, 일을 처리한 후,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을 터다.
여당과 야당이 모두 그렇게 판단했다면 분명 누군가는 판단을 잘못 했다는 것이다. 어느 한쪽 아니면 양쪽다. 문제는 이런 일이 우리 정치사에 아주 드문 일이 아니다.
마치 여야가 역할이 바뀌면 무대에 오른 주역만 다를뿐 연기는 늘 같은 주연 같은 역할까지 똑 같다.
반복되는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당연히 과거의 시행착오에서 배우는 교훈이다.우리 정치권은 왜 같은 역사를 반복하는가? 중요한 몇가지 원인을 생각해 보자.
첫째, 정쟁발생의 책임을 너무 짧게 본다는 점이다. 길게 보면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여야가 공유해야 된다는 것을 잊을리가 없다. 국민도 무섭고 역사가 무섭게 보이려면 정쟁의 책임을 좀더 긴 시각에서 책임을 지워야 한다.
둘째, 정쟁의 쟁점발의가 보다 신중해야 한다. 문제의 안건이 시대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하다면 더더욱 그렇다. 자칫 가볍거나 국민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안건을 여야의 이익개념 차원으로 다루려 한다면 국민들은 자꾸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국민이 헤프게 보여져서는 안된다. 당장이 아니라도 좋다. 국민이 서슬퍼런 눈을 뜨고 있음을 여야가 잊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물론 당장의 난장판 같은 이전투구의 현장에서 어느 당이 옳고, 그름을 판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혼탁한 시류 속에서도 국민의 몫이 있다. 국민은 국민의 그런 저력을 보일 때만 그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반복된 정쟁을 막을 수 있다.
선거권이란 얼핏 보기엔 가장 소극적인 권력일 수 있다. 그것이 무슨 권력인가 하고 반문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필자는 그 무서움에 소름이 돋는다. 잘못 사용되었을 때를 생각해 봄으로써 작은 교훈을 삼아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찌 정권의 히틀러는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게 아니다. 그도 국민의 민주투표로 정권을 잡았다. 그때, 독일 국민들은 정치권의 혼란 속에 자신들의 정치적 속 밖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우선 당장의 안정을 위해 나찌정권을 선택했다.
언론, 결사 등의 적극적 자유를 포기하고, 경제와 심리적 안정 등의 소극적 자유를 선택한 댓가는 곧바로 독재와 전쟁의 참화로 이어졌다.
독일 국민이 선거로 선택한 사상최악의 투표권행사의 선례의 예이다. 어찌 소름이 돋지 않겠는가? 이러한 선례에 대한 판독과 분석은 독일국민의 몫이였다.
그들에게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했다. 구 한말부터 한반도의 정쟁은 지형적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정치적 스페트럼.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적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역시 마지막 기대는 국민이다. 국민에게 주어진 선거심판의 기회는 무겁고 신중하게 실천될 필요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자유주의 역사는 역시 국민의 몫이다.
중앙대학교 김왕석 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