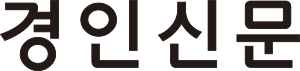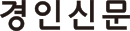육법공양 등 상단불공 의식 거행
범종 타종식과 인목왕후의 넋을 기리는 다례재가 24일 천년 고찰 칠장사(주지 지강스님)에서 거행됐다.

범종 타종식과 다례재에 앞서 열린 정통의식인 상단불공(上壇佛供)에서 명원 문화재단 안성시지부 문화학교(원장 이인자)는 육법공양(六法供養)과 함께 제를 올렸다.
육법(六法)이란 깨달음과 관련된 6가지 공양에 정신적인 상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등(초)· 향· 차· 꽃· 과일· 쌀 등 여섯 가지 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 의식이다.
또, 부처에 의지하며 그 공력을 찬양하고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보살행위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의식으로 삼국시대부터 전해오고 있다.

지강스님은 법문을 통해 “지난해 제작상의 문제로 범종을 타종하지 못했지만, 이를 다시 불사해 오늘 범종을 타종하는 새로운 날을 맞아, 희망의 범종 불사가 되었다”며 “그동안 구제역과 조류독감, 최근엔 일본 대지진 등 한국은 물론 세계가 혼란함을 겪고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강스님은 또 “좋은 종자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정성을 들여 종자를 심고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가꾸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종자도 심지 않고 열매를 기다리는 바보는 되지 말라”고 법어를 설파했다.

인목왕후(仁穆王后)는 1623년 칠장사를 찾아 ‘어필 칠언시’를 지어 칠장사 주지에게 하사하는 등 칠장사와는 인연이 깊은 것을 알려지고 있다.
이후 칠장사에서는 인목왕후의 ‘어필 칠언시’를 보존해오다 1973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던 중 2010년 국가 지정 보물 제1627호로 승격되기에 이르렀다.
‘어필 칠언시’는 선조(宣祖)의 계비(繼妃)인 인목왕후(1584~1632)가 큰 글자로 쓴 칠언절구의 시로, 종이바탕에 4행으로(각행 7자) 썼으며 근대에 족자로 장황되었다.
육법공양의 의미(등(초)· 향· 차· 꽃· 과일· 쌀)
등,초(燈),<보시>-지혜, 희생, 광명, 찬탄이며 등은 반야 등(般若 燈)이다.
등불은 지혜를 상징한다. 또한, 등불은 자기를 태워 세상을 밝히므로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며, 등불은 말 그대로 광명이며 불도량을 밝히는 찬탄이다.
향(香)<지계>-자유로움, 희생, 화합, 공덕으로 향은 해탈향(解脫香)이다.
향은 제한된 고체의 몸을 버리고 훌훌 연기가 되어 자유로운 몸이 되어간다.
우리는 명예, 돈, 권력에서 해탈되어야 한다. 향은 해탈, 자유로움을 상징한다.
꽃(花)<인욕>-수행, 장엄, 찬탄이며, 꽃은 만행 화(萬行 花)이다.
꽃은 피기 위해 온갖 인고의 세월을 견딘다.
꽃은 만행을 상징하며 불도량을 화려하게 장엄하며 찬탄한다.
과일(果)<정진>-깨달음이며, 과일은 보리과로 열매를 뜻한다.
우리들의 수행과 공부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다.
깨달음의 열매가 영글어 가는 공부가 기도, 참선이다.
차(茶),(청수)<선정>-만족, 청량, 다선일여(茶·禪一如)라 선정을 표현한다.
목마를 때 마시는 한 잔의 물은 말 그대로 감로다(甘露茶)이다.
부처님의 법문은 만족과 청량함을 준다. 즉, 청수의 공양은 만족과 청량을 의미한다.
쌀(米)<지혜>-깨달음의 기쁨, 환희 쌀은 선열미(禪悅米)이다.
선열은 법락(法樂)이다. 법락이란, 불교를 믿으면서 일어나는 기쁜 마음들이다.
쌀은 사리라(sarira)의 어원을 가진다. 쌀 공양은 기쁨을 상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