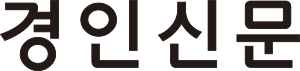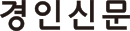왜곡된 호칭을 되찾기 위한 '지루하고 고단한 길'은 아직 멀었는가
 |
[경인신문 이설아 논설위원] 한 번 왜곡된 호칭을 올바르게 되찾아주는 일은 지루하고 고단한 길이다. 특히나 여성들에 대한 호칭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편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회적 편견이 아직 작동해서인지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독립운동을 하다 사망한 위인들에게 우리는 '의사'나 '열사'를 붙여 예우를 다했지만, 유관순 열사는 꽤 오랜 기간 '유관순 누나'로 불리었다. 여성계의 몇십 년에 걸친 투쟁이 있고 나서야 유관순 열사가 열사로 제대로 기재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돌연 꺼내는 이유는, 최근 논란이 된 정의기억연대 관련 건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였던 이용수 운동가가 언론에 자꾸 '할머니'로 표현되는 것이 거북해서이다. 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어 정의연 건에 대해 글을 쓰는 일을 지양하고 있었으나, "30년간의 운동 방식이 잘못됐다"며 운동 노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이용수 운동가를 단순히 '할머니'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라도 더 얹어 문제를 제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미 지난해 초 故 김복동 운동가가 작고하셨을 때에도 각계에서 많이 지적된 일이었다. 여러 사회 문제에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낸 운동가에게 왜 성별과 나이의 정보만을 담은 ‘할머니’라고 부르는가. 당시 추모제에서 역시 故 김복동 운동가를 ‘여성 인권 운동가’로서 그 역할을 명확히 지칭했지만 유독 언론에서는 ‘김복동 할머니의 추모제’라며 추모제 취지와 엇박자의 기사를 내놓았다. 1년여가 훌쩍 지금도 이러한 행태가 바뀌지 않고, 이용수 운동가가 여전히 이용수 할머니로 표기되는 현실을 보니 ‘지루하고 고단한 길’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피해경험자들을 으레 ‘할머니’라고 표기하는 것 외에도 부적절한 언론의 호칭 기재 방식 예는 꽤 존재한다. 필자가 타 언론사 기자로 근무할 시 청소년을 ‘양’과 ‘군’으로 부르는 행태에 대해서도 사설로 문제를 제기했던 바가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그 사람이 가진 직위를 최우선적으로 불러주는 관행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청소년이 대상이라면 호칭을 성에 따라 ‘양’이나 ‘군’으로 고정하기 때문이다. 성별과 나이가 모든 것을 퇴색시킨다는 지점에서 ‘할머니’의 호칭과 다를 바 없다.
사실 이 문제에 관심 있던 사람이면 이 글과 흡사한 내용의 주장을 이미 많이 접해, 새로울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술했듯 끊임없이 문제를 환기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동어반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일시에 이용수 운동가가 운동가로 제대로 기억되길, 정의연 논란 또한 이치에 맞게 해결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