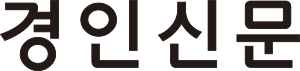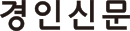일완 홍범식 선생은 을사조약을 파기하도록 상소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민영환이 그에 항거하여 자결하자 경술국치를 당한 1910년 8월29일 저녁 사또가 망궐례를 행하는 곳인 객사 뒤뜰 소나무 가지에 목을 맨 채로 자결했다.
위 글은 최근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려고 오락가락 철새 짓을 하는 일부 정치인들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자신이 섬기던 임금이 사면초가에 이르자 못난 신하들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목숨까지 버렸던 충신들의 기백이 새삼 존경스러울 뿐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요즘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이름커녕 되래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다. 달콤한 것만 쫓아다니는 일부정치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홍범식 선생의 글이 떠오르곤 한다.
義理(의리)는 말은 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치권의 의리는 특정 계파의 생명력을 지탱해주는 정서적 원천이고, 정당의 내부 분열을 막는 울타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의리를 강조하며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의리가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라는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은 보수정당의 기풍(氣風)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짧지만 강한 발언이다. 바른 정당 탈당파는 순간 잘못 판단으로 이른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따지고 보면 탈당파의 행동은 쉽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
내년 지방선거와 2020년 21대 총선을 염두에 둔 계산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복당이나 합당은 대선이 끝난 후에 추진했어야 했다. 6월 이후에 정치권에 정계개편 회오리가 불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탈당파 12명 중 3선 이상 의원만 10명이다. 본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헤아리고 처신 할 수 있는 연륜이 있는 의원들이다. 바른 정당 탈당파가 보수 결집이라는 대의 때문에 탈당을 했든 개인적 이해관계로 복당을 결정했든, 본인 선택에 따른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철새 정치인들의 현재는 재기 불능 상태로 가히 비극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새라는 낙인은 주홍글씨로 남아 평생을 따라다닌다. 뼈를 깎는 노력에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권의 경험칙이다.
통일민주당에서 새누리당까지 여야를 넘나들며 무려 16번 당적을 바꾼 이인제 자유한국당 의원과 2007년 3월 한나라당 경선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대표 철새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이인제 의원은 한때 대권을 넘본 잠룡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그런 의원이고,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도 한번 바꾼 당적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철새 정치인은 미래가 없다. 보수 결집이라는 대의를 내세워 탈당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역풍을 뼈를 깎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안성뉴스24
webmaster@asn24.com